<환영기도>
1) 환영기도는 일상생활 속, 사건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활동)하심에 동의하는 방법입니다.
2) 환영기도의 목적은 우리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동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3) 환영기도는 습관화된 감정 프로그램의 패턴을 내려놓고 마음 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환영기도는 향심기도에서 시작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1.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으로(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2. 지금 이 순간 몸으로(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내 안에 들어오도록 동의하고 환영하세요.
3. 나는 안정, 애정, 통제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며 놓아주세요.
환영기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나의 치유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나는 환영합니다.
모든 생각, 느낌, 감정, 사람, 상황, 조건을 환영합니다.
나는 안전하려는 욕망을 흘려보냅니다.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흘려보냅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을 흘려보냅니다.
나는 상황, 조건, 사람,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욕망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엽니다.
Welcome, welcome, welcome.
I welcome everything that comes to me today,
because I know it's for my healing.
I welcome all thoughts, feelings, emotions, persons, situations, and conditions.
I let go of my desire for power and control.
I let go of my desire for affection, esteem, approval, and pleasure.
I let go of my desire for survival and security.
I let go of my desire to change any situation, condition, person or myself.
I open to the love and presence of God and God's action within. Amen.
*삶의 작은 일들, 교통 체증에 갇히거나 마트에서 긴 줄을 서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화나가고 짜증나는 순간부터 환영기도를 연습해 보세요. 작은 일들을 연습하면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환영기도의 실제>
목차
서문 / 저자 소개
1. 포기과 항복
2. 의도와 행동
3. 한 가지 필요한 것
4. 의지의 역할
5. 12단계 프로그램과의 조화
6. 집착
7.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
참고문헌 © 2005 Cherry Haisten – All rights reserved.
서문
환영기도(Welcoming Prayer)는 매일의 삶 속 현재 순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 실천입니다. 이 기도는 Contemplative Outreach의 故 수석지도교사 메리 므로조브스키(Mary Mrozowski)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주로 토마스 키팅 신부의 가르침과 18세기 장 피에르 드 코사드(Jean-Pierre de Caussade)의 저서 하느님의 섭리에의 내맡김(Abandonment to Divine Providence)의 지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거짓 자아(false-self) 체계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추구하는 가치들을 다룹니다. 환영기도의 사상적 배경은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문화적 사고방식(우리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방식)에 도전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그 사상적 배경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체리 헤이스튼(Cherry Haisten)은 시애틀의 세인트 앤드류 성공회 교회에 있는 기독교 형성 센터(Center for Christian Formation)의 디렉터입니다. 그녀는 Contemplative Outreach의 위임을 받아 향심기도(Centering Prayer)와 환영기도를 오랫동안 가르쳐 왔으며, 1993년부터 환영기도를 실천해 왔습니다.
1. 포기와 항복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하고 너희 생명을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곡식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을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 영광 가운데 이 꽃 하나만큼도 입지 못했다. 오늘은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처럼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25–30)
관상기도(Contemplative prayer)는 ‘순수한 믿음의 기도’라고 불려왔습니다. 관상의 길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인 향심기도와 환영기도 역시 순수한 믿음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완전히 신뢰하여,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들처럼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에 관한 말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는 신뢰의 수준은 대부분의 현대 문화 속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르쳐온 가치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 네 계획을 실행해야 해! 모든 일을 네 손으로 정리해야 해! 은퇴 자금을 스스로 준비해야 해!”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는 미국 문화에 깊이 스며있습니다. 미국은 ‘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일하지 않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비미국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 죄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들의 백합화처럼 산다는 것은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지탱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백합화의 ‘일’은 바람에 흔들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흙과 공기와 물에서 영양분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은 훨씬 복잡하지만, 역시 존재와 행위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하고, 그것은 곡식을 심고, 갈아 밀가루를 만들고, 빵을 굽고, 다른 음식을 곁들이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에 따라 우리의 몫을 감당하길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되시도록 맡길 때, 우리는 자신답게 살며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백합화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열고 신뢰를 길러간다면, 백합화와 새들이 누리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상상하기 어렵다면, 시인 데니스 레버토프(Denise Levertov)의 시 「서약(The Avowal)」이 생생한 그림을 제공해 줍니다.
물 위에 얼굴을 두고 눕는 수영선수처럼,
물이 그를 떠받쳐 주듯,
공중에 깃을 맡긴 매처럼,
바람이 그를 받쳐 주듯,
나도 배워가리라.
힘을 빼고 떠올라
창조주의 영이 깊이 끌어안는 품에 안기기를,
아무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두루 퍼진 은혜 속으로.
레버토프가 묘사하는 신뢰는 거의 ‘포기(abandonment)’에 가깝습니다. 메리 므로조스키는 환영기도라는 대표작을 만들 때, 18세기 초 장 피에르 드 코사드(Jean-Pierre de Caussade)의 저서 『하나님의 섭리에의 포기(Abandonment to Divine Providence)』에 크게 의지했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현대에선 인기가 없습니다. 영어 abandon은 ‘다른 사람의 통제에 자신을 맡기다’, ‘버리다’, ‘자유롭게 풀어놓다’ 등 긍정·부정의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자신을 무언가에 맡기다’라는 긍정적 영적 뉘앙스도 있었으나, 오늘날은 버려짐, 방치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사드는 첫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그가 정의하는 ‘포기’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치명적 결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찾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핵심요약>
포기와 항복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몫을 다하되, 결과와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백합과 새처럼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걱정 대신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는 태도는 영적 성장의 큰 장애물이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2. 의도와 행동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일을 합니다. 나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로마서 7:15, 18-20)
의도와 행동 사이의 괴리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유명한 구절에서 이 인간의 딜레마를 매우 절실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원하면서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의도하지만, 다른 일을 합니다.
의도란 어떤 것을 향한 의식적인 목표나 목적입니다. 그것은 숙고에서 비롯됩니다. 의도적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그 의도를 순간순간 지키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는 의식 수준에서의 선택을 내포합니다. 영적 자각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의도는 더욱 분명하고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의도를 기억하고 지키는 우리의 능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도는 종종 향심기도(centering prayer)의 핵심이라고 묘사됩니다. 향심기도에서 우리의 의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내적 활동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하루의 나머지 23시간에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그 의도를 이어가, 모든 상호작용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의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분명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종 우리의 무의식적 동기 때문입니다.
키팅 신부는 “동기가 모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동기는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동기(motive)’라는 단어는 ‘움직이다’라는 뜻에서 나왔으며, 어떤 사람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내적 추진력이나 충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탐욕이 그 한 예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동기는 발달 단계상 당연한 것입니다. 애정과 존경, 통제와 권력, 안전과 안정에 대한 필요가 우리의 행동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하면, 그 행동은 강화되어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평생에 걸친 행복 프로그램과 키팅 신부가 말하는 거짓 자아 체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 패턴은 예전처럼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단 두 개의 프로그램만 입력된 로봇처럼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며,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행동 동기는 이러한 오래된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 순수한 동기가 애정/존경, 통제/권력, 안전/안정이라는 거짓 자아의 욕구로 섞입니다. 키팅 신부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에너지 센터라고 불렀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동기는 대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다니의 마르다처럼, 우리는 종종 옳은 일을 하지만 그 이유가 순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섞인 동기에 얽혀 가장 깊고 순수한 의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외부 자극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잘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둘째, 혼합된 동기를 자각할 때, 가장 순수한 의도를 기억하고 행동 속으로 돌아가도록 자신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완벽한 주인의 역할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마리아처럼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부엌에만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를 질투하고 화를 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날 모두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즐기고 있을 때, 저는 몇 시간이나 일한 끝에 여전히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다가, 제가 가장 긴장하는 ‘그레이비 만들기’ 단계가 되어서야 나타납니다. 저는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래된 분노와 질투가 올라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섞인 동기가 지배합니다. 가장 깊은 동기는 섬김이지만, 다른 동기들이 감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감정은 우리의 행복 프로그램에 집착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깨끗한 집, 아름답게 차려진 식탁, 덩어리 없는 그레이비 같은 많은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핵심요약>
의도는 의식적인 목표지만, 무의식 속 거짓 자아의 동기(애정/존경, 통제/권력, 안전/안정)가 순수한 의도를 흐립니다.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기중심적 욕구가 개입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자기 인식과 순수한 의도로 돌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섬김의 동기 속에 질투·분노가 섞일 수 있으며, 예수님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3. 한 가지 필요한 것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한 가지 필요한 것(the one thing needful)”을 정의하는 데 셀 수 없이 많은 시간과 페이지를 할애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각각 활동적인 삶과 묵상적인 삶의 전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키팅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비』에서 이에 반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삶의 방식이 더 완벽한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의 ‘질’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행동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녀의 선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동기입니다. 봉사의 질은 행위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의 순수성에서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눈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예수님이 발밑에 앉아 있던 마리아를 옹호하신 것은 게으른 사람들이 집안일을 피하라는 변명이 아닙니다. 또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묵상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 나와 도와주지 않는다고 짜증내라는 이유도 아닙니다.
묵상적 태도는 사랑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래서 로렌스형제처럼 마르다도(저 역시 그랬듯이)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조셉 추-콩은 『묵상 체험(The Contemplative Experience)』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는 클레어보(St. Bernard of Clairvaux)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랑이 “묵상 체험을 추구하는 데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체험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길, “이 수준의 사랑은 직접적이고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까지도 그 아래 두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한 가지 필요한 것(one thing necessary)’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행동과 기도의 통합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고 키팅 신부는 말합니다(『그리스도의 신비』 51쪽). 행동이나 묵상보다 더 깊고, 그 둘을 근본적으로 관통하고 통합하는 무언가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하나로 묶습니다. 묵상에 치우친 사람들은 이 통합된 태도를 묵상적 삶의 접근법이라 부르지만, 저는 이것이 행동과 묵상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행동과 묵상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별개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삶과 인간은 이 둘을 각각 다른 비율로 혼합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행동을 스며들게 하고 침투시킵니다. 묵상 없는 행동은 최악의 경우 메마르고, 오만하며,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키팅 신부는 말합니다. “묵상 상태는 쉼과 행동을 동시에 가능케 하며, 왜냐하면 그것이 쉼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곳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르다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묵상적인 역할 대신 활동적인 역할을 선택한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선택한 역할에 존재하지 않음(presence), 즉 그 역할을 사랑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열려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요리하거나 설거지를 하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묵상이든 활동이든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 성령의 움직임에 순간순간 존재하며 사랑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행동에 동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 장-피에르 드 코사드, 여러 시대의 영적 스승들과 추구자들, 토마스 케이팅, 그리고 메리 므로조스키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들려옵니다.
요약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삶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의 질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묵상 체험의 본질이며, 이는 자기 자신마저도 초월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행동과 묵상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는 두 요소이며, 묵상이 행동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열려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4. 의지의 역할
우리는 향심기도(centering prayer)와 환영기도(welcoming prayer)가 항복(surrender)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영적 유산소 운동처럼 반복해서 우리에게 항복할 기회를 줍니다. 미묘한 내적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도(intention)로 돌아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행동에 동의(consent)하는 선택을 실행합니다. 키팅 신부에 따르면, 이것은 의도와 동의의 연습입니다. 키팅 신부가 향심기도에 대해 말한 바는 환영기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기르는 것은 우리의 의지, 즉 선택 능력입니다. 의지는 또한 영적 사랑의 능력이기도 하는데, 사랑은 주로 선택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수반될 수는 있지만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신성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항복과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이라는 태도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생명체에게 가지시는 관심과 유사합니다.”
의지는 흔히 우리의 자아가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 발휘하는 힘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의지력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제가 의지력을 사용해 무언가를 이루거나 행동을 바꾸려 결심할 때, 제가 가하는 압력은 모든 것을 폭발시키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엄청난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되풀이되는 분노의 폭발 후, 죄책감과 슬픔, 후회와 고통 속에서 저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한 의도가 아무리 컸어도, 제 결심은 얼마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 결심을 지속하지 못한 저 자신을 보며, 저는 이 현실에 ‘의지’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결심, 의지력, 의지의 강요—그런 의지는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거나 목표를 이루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즉 우리 자신의 내면 악마와 맞서야 할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름을 물속에 누르는 것과 같아서, 악마가 결국 이기고 우리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전환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력을 인정하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의지력을 사용해 보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인지요.
저는 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통제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않으며, 저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운 존재가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음을 기쁘게 인정합니다.
이 ‘뒤집힌(upside-down)’ 의지 개념은 우리의 인간적 힘을 통제와 지배에서 찾는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맡기고 내려놓는 데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선택하고 동의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행사합니다.
동의를 통해 우리의 의도는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기 같은 전능감으로, 이는 폭군적이고 두려움을 주며 “내 방식대로 하든가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둘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의지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 우리의 의지는 후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제럴드 메이는 『의지와 영』에서 이 두 가지 의지를 각각 ‘의지 강요(willfulness)’와 ‘의지 수용(willingness)’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의지 강요를 자급자족, 자기 결정, 통제와 지배, 그리고 삶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본 태도와 동일시합니다. 반면 의지 수용은 자기 항복, 숙달, 그리고 삶에 대해 ‘예’라고 말하는 기본 태도와 같습니다.
메이는 말합니다:
“의지는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의지 강요로 확장되는 경향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널리 인정받는 현대적 해결책은 의지를 사랑으로 절제하고 균형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칼 융은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 의지가 없다. 권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롤로 메이는 ‘사랑 없는 의지는 조작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메이는 놀랍게도 “우리는 모두 중독자”라고 관찰하며,
“중독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의지 강요가 의식과 존재의 불가역적인 신비에 맞서 싸우는 양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의지 강요에도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사고를 고치는 방법은 마음을 열어 부드럽게 ‘의지 수용’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메이가 말하듯 ‘밑바닥에 떨어지는(rock bottom)’ 경험을 통해 오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묵상 수행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성 베르나르 드 클레르보의 전통적인 언어로, 또다시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의지의 일치(conformity of will)”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한 태도가 매우 투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태도와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추-콩은 이것이 “서로 껴안는 상호 체험(mutual embrace)을 나타내는 베르나르의 표현”이라고 지적합니다. “언어를 통해 매개되는 마음의 동의와 달리, 사랑의 포옹은 직접적이고 완전한 친밀함”이라고 그는 씁니다.
<핵심요약>
향심기도와 환영기도는 항복/포기 연습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의도’와 ‘동의’를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수행입니다.
진정한 영적 의지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지 수용(willingness)’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 강요에 중독되어 있지만, ‘밑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이나 묵상 수행을 통해 마음을 열고 의지 수용 상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5. 12단계와의 상호 보완
인간 의지의 한계에 대한 통찰은 오랜 시간 12단계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향심기도(centering prayer)는 환영기도(welcoming prayer) 수행과 함께 알코올중독자 익명모임(Alcoholics Anonymous, AA)의 12단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심기도 수행자이면서 또한 알코올 중독 회복자였던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매일 향심기도를 하면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단지 20분 기도 시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각을 일상 속으로 옮기고 싶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향심기도는 항복(surrender)하고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3단계가 번쩍 스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의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술을 끊기 위해 나는 3단계를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해서 실행했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마틴 신부님의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그분께 맡기겠다.’라는 말이 경쾌하면서도 깊은 의미로 떠올랐습니다.”
6. 집착(Attachment)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자신의 역할에 지나치게 동일시하거나 집착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자신의 역할, 생각, 감정, 그리고 계획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환영기도 수행을 가르쳐 온 메리 드와이어는 제럴드 메이(Gerald May)의 지혜를 인용하면서, ‘attach(집착하다)’라는 단어가 오래된 프랑스어 명사로 ‘못(nail)’을 뜻하며, 동사로는 ‘못박다, 못에 붙다’를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마치 못에 박히듯 그것에 단단히 연결되어 거의 뗄 수 없게 됩니다. 즉, 너무 가까워서 분리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형성한 오래되고 쓸모없어진 ‘행복 프로그램’에 대한 집착입니다. 오랜 사용으로 인해 이것들은 완전히 뿌리내린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삶의 배경음악처럼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는 녹음테이프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에게 잘 봉사했습니다. 이것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인이 된 지금, 더 이상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을 자동기계처럼 계속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에너지 센터 주변에 군집하여 딱딱하게 굳어지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 센터들은 ‘동기 부여의 중심’으로서, 세 가지 주요 본능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정/존경, 통제/권력, 안전/보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163쪽 참조).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에너지 센터들을 중심으로 한 행복 프로그램은 잘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조건의 계속된 깨짐 속에 태어났기에 모두가 실제 또는 인지된 결핍을 경험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방법들은 성숙함에 따라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아기에게 효과적인 방법은 십대나 20대, 더 나아가 중년 성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길을 따라가며, 같은 녹음테이프를 반복 재생하여 옛 방식으로 욕구를 채우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과정은 마치 벽돌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과 같아 고통을 일으키고, 아무런 결실도 없으며, 완고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가 좌절되면 온갖 고통스러운 감정들—분노, 무관심, 시기/질투, 슬픔, 욕망/탐욕, 교만—이 에너지 센터에 저장되어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초래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거짓 자아 시스템(false-self system)’을 해체할 때 가장 먼저 이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즐거운 감정도 개인 영성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는 덜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는 더 크거나 작게 재앙적인 결과로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약
‘집착’은 못에 박히듯 어떤 것에 단단히 연결되어 쉽게 떼어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행복 프로그램들은 어렸을 때는 효과적이었지만, 성인이 되면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은 분노, 질투, 슬픔 등 고통스러운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런 감정들이 터질 때 우리는 ‘거짓 자아 시스템’을 해체하기 위해 도움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7. 도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 프로그램’과 집착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도와줄 도구가 필요합니다. 많은 도구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좋은 도구 하나는 ‘환영기도(welcoming prayer)’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숨겨진 무의식적 동기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돕습니다. ‘열까지 세기’ 같은 오래된 방법에도 큰 지혜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기본 도구를 넘어 행동의 자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향심기도(centering prayer)’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를 가져옵니다. ‘환영기도’는 하루 23시간 동안 순간순간 선택의 자유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반응성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감정 버튼이 눌릴 때, 에너지 센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로든 흘러가야 하는데,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된 에너지를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표출하면, 우리의 행동은 부적절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도 재앙적이거나 적어도 불운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아쇠와 행동 사이에 숨 쉴 틈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기본 프로그램대로 행동하지 않고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 분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분별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반복해서 행동하신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동이 단지 몇 마디 말의 교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할 수도 있고, 학대 행위에 대해 누군가를 맞서야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모든 의사소통 기술과 영적 자원을 동원하는 큰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도구로서 적절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향심기도, 환영기도, 기타 수행을 통해 양파 껍질을 벗기듯 우리의 내면을 벗겨나갑니다. 어쩌면 껍질을 벗기면 진정한 자아가 드러날지도 모르고, 혹은 진짜 자아와 거짓 자아가 얽힌 덩굴을 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스크 아래 숨겨져 있듯 한꺼번에 벗겨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껍질을 벗기고 얽힌 것을 푸는 과정은 평생 걸릴지도 모릅니다.
향심기도와 환영기도 수행을 통해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치유 행위에 자신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동기와 의도에 대해 쉽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정하거나 느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감정의 고통을 피하려다 보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부정과 회피를 오래 지속할수록 더 오래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키팅 신부가 말했듯 “우리가 행복을 찾는 방향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덜 고통스러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길도 고통이 있지만, 고통은 훨씬 깊고 큰 기쁨으로 상쇄됩니다.
《공동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의 세례 언약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악을 저항하는 데 굳세게 나아가겠습니까? 죄에 빠질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예배 중 사회자가 이 질문을 하면, 모든 신도들은 힘차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의도에서 멀어질 때마다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질문에 사용된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 ‘언제든지(whenever)’이지 ‘만약(if)’이 아니다. 즉, 죄에 빠질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죄에 빠질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떨어지고, 대부분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낮이 밤을 따르듯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즉, ‘기억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구덩이에서 다시 기어 올라가야 하며, “행복을 찾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키팅 신부에 따르면 회개는 “복음에서 치유 과정을 시작하라는 근본적 부름”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횟수는 거의 무한할지도 모릅니다.
조직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죄(sin)’라는 단어가 ‘분리(asunder)’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졌다고 추측합니다. 그는 죄를 ‘자신과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로 정의합니다. 다른 곳에서 틸리히는 죄를 ‘소외(estrangement)’라고도 말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제럴드 메이는 “죄는 자기 이미지와 개인 의지가 너무 중요해져서 자신의 참된 본성, 즉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신성한 권능과의 절대적 연결성 및 근거를 잊거나 억압하거나 부인할 때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것은 집착이 심할 때마다 일어난다”고 덧붙입니다.
관상 수행(향심기도, 환영기도 등)은 우리의 집착과 계획을 놓아버리는 데 관한 것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동기는 어디에서 올까? 제럴드 메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집착이 당신의 동기가 아니게 될 때, 당신의 행동은 신성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이 줄어들면, 키팅 신부는 성령의 행동이 대신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관상기도의 과정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활동에서 점점 더 성령의 선물이 기도의 원천이 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가 비켜서면 성령께서 대신 하십니다.
향심기도와 환영기도는 우리의 에너지 센터와 거짓 자아의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고,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점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고통스럽거나 불쾌했던 부분들이 의식에 드러날 때 우리는 자유를 찾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미로 속 쥐와 같습니다. 우리는 옛 프로그램, 옛 습관, 자동기계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자유라는 출생권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기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행복 프로그램과 숨겨진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충실한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환영기도는 무의식 속 숨겨진 동기를 자각하게 하고, 감정적 반응과 행동 사이에 ‘숨 쉴 틈’을 만들어 분별할 기회를 줍니다.
향심기도와 환영기도 수행을 통해 자신 안에 쌓인 거짓 자아와 집착의 껍질을 벗겨내며, 하나님의 치유와 변화를 경험합니다.
죄는 우리 자신, 서로, 하나님과의 ‘분리’이며, 집착이 심할 때 죄가 발생합니다.
집착을 놓으면 우리의 동기는 신성한 사랑으로 바뀌고,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회개와 돌아감은 끊임없는 과정이며, ‘언제나’ 돌아갈 것을 약속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REFERENCES
1 All scripture quotes are from Harper Collins Stud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 1993.
2 The Stream and the Sapphire: Selected Poems on Religious Themes (New
York: New Directions, 1997), 6.
3 Abandonment to Divine Providence, trans. John Beevers (New York:
Doubleday Image, 1975).
4 The Compact Edition o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1971 ed., s.v.
“abandonment” and “abandon.”
5 John Beevers, trans. In his introduction to Abandonment to Divine
Providence.14.
6 Awakenings (New York: Crossroad, 1990), 8.
7 Parker Palmer, Let Your Life Speak: Listening for the Voice of
Vo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88.
8 Will and Spirit: A Contemplative Psychology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82), 3.
9 Cynthia Bourgeault, “Re-Learning Surrender: Christian
Transformation as Radical Consent,” a course taught at Vancouver
School of Theology, Vancouver, British Columbia, July 17-21,
2000. Many of the ideas Bourgeault took up in this course have also
appeared in her written work. See, for example, her recent book
Centering Prayer and Inner Awakening (Cambridge: Cowley, 2004), in
which she includes a chapter about the welcoming prayer. See also
her earlier article “Centering Prayer as Radical Consent,”Sewanee
Theological Review 40:1 (1996), 46-54; reprinted in The Diversity of
Centering Prayer, ed. Gustave Reininger (New York: Continuum,
1999), 39-50.
10 Mystical Hope: Trusting in the Mercy of God (Cambridge: Cowley,
2001), 55-56.
11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of the American Language, 1968 ed.,
s.v. “motivation.”
12 The Mystery of Christ: The Liturgy as Spiritual Experience (New
York: Continuum, 1996), 50.
13 The Contemplative Experience: Erotic Love and Spiritual Union (New
York: Crossroad, 1999), 82.
14 Open Mind, Open Heart (Amity, NY: Amity House, 1986), 75.
15 Intimacy with God (New York: Crossroad, 1995), 57.
16 The Twelve Steps for Everyone . . . who really wants them.
(Minneapolis: CompCare, 1977), 17.
17 Gerald G. May, Addiction & Grace: Love and Spirituality in the
Healing of Addictions (HarperSanFrancisco, 1988), 3.
18 The Book of Common Prayer (The Seabury Press, 1979), 304.
19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8), 154-55.
출처: https://www.contemplativeoutrea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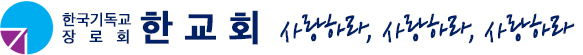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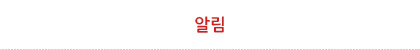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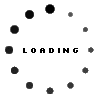
댓글0개